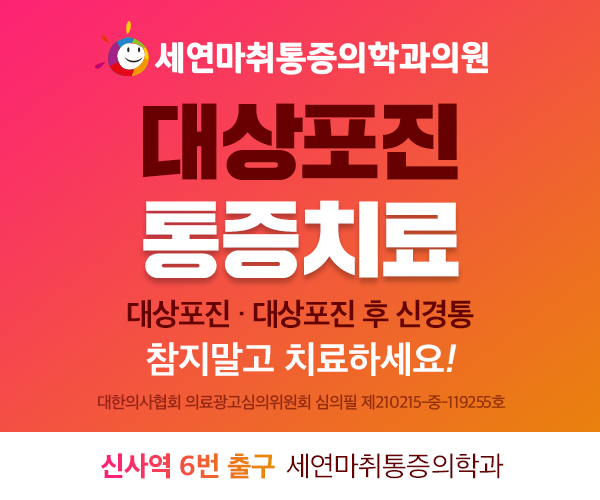BIZ
예금금리, 다시 `연 2%` 시대로..저축은행·인뱅마저 하락
 예금금리가 다시 연 2%대 시대로 돌아오고 있다. 시중은행을 포함해 저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까지 예금금리가 하락하며,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예금금리의 하락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은행 예금액은 감소하고 있으며, 그 대신 증시와 같은 투자처로 대기성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특히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고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성 예·적금 상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예금금리가 다시 연 2%대 시대로 돌아오고 있다. 시중은행을 포함해 저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까지 예금금리가 하락하며,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예금금리의 하락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은행 예금액은 감소하고 있으며, 그 대신 증시와 같은 투자처로 대기성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특히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고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성 예·적금 상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12개월 만기 기준으로 연 2.70%에서 3.31% 사이로 제공되고 있다. 이는 한은이 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일단 멈춘 상황에서도 여전히 시중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금리가 비교적 높았던 인터넷전문은행들도 금리 인하에 동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케이뱅크는 대표적인 예금 상품인 코드K 정기예금 12개월 만기 금리를 연 3.00%에서 2.90%로 0.10%p 낮추었고, 카카오뱅크는 12개월 만기 기준 연 3.10%, 토스뱅크는 6개월 만기 기준으로 연 3%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도 예금금리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79개 저축은행의 6개월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2.88%로 한 달 전보다 0.14%포인트 하락했다. 또한, 12개월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도 3.15%로 한 달 전보다 0.15%포인트 떨어졌다. KB, 신한, 하나, 예가람 저축은행 등의 12개월 만기 예금금리는 연 2.90%로 3%를 밑돌며, 금리 하락 현상은 제2금융권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예금금리 하락과 맞물려, 예금자들의 수신액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은행권의 정기예금은 21조 원 감소했다. 이는 11월에 비해 29조 원의 감소로, 예금자들이 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예금을 줄이고 있다는 신호다. 저축은행의 수신액도 마찬가지로 고금리 상품이 인기를 끌었던 2022년 말 120조 원을 넘어섰으나 최근에는 100조 원 안팎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의 수신액은 103조 3649억 원이었다.

반면, 금리가 낮아지면서 투자자들은 대기성 자금을 증시나 다른 투자처로 이동시키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식 투자 대기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3개월 전보다 9.6% 증가한 54조 6734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머니마켓펀드(MMF)의 규모도 급증해 지난해 말보다 27% 증가한 212조 413억 원에 달했다. 이는 예금금리가 낮아지면서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나 파킹형 자산에 자금을 배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고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성 예·적금 상품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은행 이자와 정부 기여금까지 합쳐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상품으로, 특히 정부의 기여금이 확대되면서 연 9%대의 적금 효과를 제공한다. 지난해부터 정부 기여금이 증가하면서 이 상품은 많은 이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1월, 청년도약계좌의 신규 신청자는 17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하루 평균 2만4300명 이상이 신청한 셈이다. 이는 12월에 비해 5배 이상 급증한 수치로,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월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6일까지 총 11만6000명이 신청했으며, 하루 평균 신청자는 약 2만9000명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청년도약계좌는 고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많은 이들이 선택하고 있으며, 정부의 기여금과 결합된 혜택은 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차이를 보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금리 인하로 예금자들은 예금을 줄이고, 그 자금을 증시나 고금리 상품으로 이동시키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예금금리는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예금을 줄이고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움직이고 있다. 금리 하락에 따른 금융 시장의 변화는 예금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증시로의 자금 이동과 고금리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트렌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